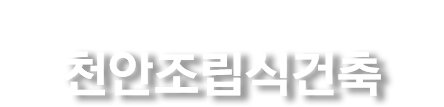“유럽과 중국은 지금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인터넷은 국내가 아닌 전체 시장을 봐야 합니다.”
네이버 ‘총수’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틀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사와 내가 부족했다’는 전제를 달고 한 말이었지만, 짧은 말에는 안팎의 지적을 대하는 이 전 의장의 본심이 녹아 있는 듯했다. “지금은 해외 기업과 대결해야 하니 지적보다 힘을 실어줄 때”란 것이다. 하루 종일 네이버 검색광고 폭리부터 자사 결제서비스에 대한 특혜, 웹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지적한 의원들은 맥이 빠지는 상황이 됐다.
이 전 의장의 발언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해외를 상대로 맞설 힘을 달라’고 했던 기존 재벌의 구태의연한 논리와 닮았다. 삼성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애국심 마케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 있어 시민의 공분을 불렀다.
재벌의 애국심 마케팅은 구시대의 유물이 돼 가고 있는데, 기존 재벌과 다르다던 네이버는 구시대의 핑계를 또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네이버가 해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애국을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네이버의 해외 진출 성공작이기도 한 계열사 라인의 자산총계는 2조6000억원대인데 일본 현지법인이다. 라인은 국내 법인으로 잡히지 않아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위기 때마다 한국 기업임을 홍보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지법인 형태로 자산을 해외에 쌓으며 국내 기여를 늘리지 않는 기존 재벌의 행태가 연상된다.
무엇보다 국내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소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양립하기 힘든 것인 양 생각하는 틀이 문제다. 국내에서 자사의 행태로 피해를 받는 다른 경제주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애국이고, 성장 못지않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다.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회사를 키우는 게 먼저이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전 의장은 국감에서 ‘엔지니어이기에 사회적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네이버가 미래의 산업이라 장기적으로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총수가 엔지니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미래 산업이라고 대중에게 당장의 피해를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말한 대로 기술의 존재 이유는 ‘인간’에 있다. 해외 진출 등 허울 좋은 핑계를 대기 전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도리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는 ‘미래의 흉기’ ‘외세보다 무서운 애국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